[고전 다시 읽기] 걸리버 여행기
[고전 다시 읽기]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Jonathan Swift)
첫 느낌부터 말해야겠다. ‘충격이었다.’ 이 문장 외에 다른 대치어를 찾기는 힘들다.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가듯 책을 구입했고, 읽어 나갔다. 1부 소인국 나라와 2부 거인국의 나라를 읽을 때까지는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단지 어린이 동화용으로 읽던 느낌과 조금 다르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3부에서는 뭔가 구린 냄새가 났다. 한 마디로 이상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리버 여행기가 아니었다. 약간 위험하다는 느낌, 뭔가 과격하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다. 마지막 말의 나라에서는 노골적이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풍자하는 대화는 기겁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우리 안의 호랑이만 보았다. 그것도 늙어 이빨이 빠지고 힘없이 주저 앉아있는 호랑이였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쇼’하는 동물원이 호랑이었다. 그러나 개작되지 않는 원전 번역판은 초원에서 군림하는 야생의 호랑이었다. 은밀하게 접근하여 맹렬(猛烈)하게 공격한다. 도망가는 사슴을 거대한 앞발로 짓이겨 버린다. 비틀거리는 사슴의 목을 누르고 포효(咆哮)한다. 두려움마저 들었다. 이게 진정한 걸리버 여행기란 말인가. 약간은 긴장되고, 약간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저자를 찾아가 보았다.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추적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 가기 시작했다.
1667년, 아일랜드 출생, 어릴 때부터 백부의 손에서 자라났으며,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한다. 영국 런던으로 건너와 어머니의 먼 친척인 W. 템플경 아래서 비서 생활을 한다. 당시 W. 템플경은 정치계의 거물이었고, 영국의 정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곳에서 고전과 역사를 배우고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정계 진출을 꿈꾼다. 도중에 아일랜드로 돌아가 사제가 되었으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 템플 경 아래서 활동한다. 1690년대부터는 시와 문장을 배운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이 1704년 ‘책들의 싸움’과 ‘통 이야기’다. 여기서 먼 훗날 스위프트의 명작 ‘걸리버 여행기’의 쓰게 될 씨앗이 된 작품이 ‘통 이야기’다.
통이야기는 카톨릭과 개신교, 영국 국교회의 싸움을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웃옷을 서로 차치하려는 세 아들의 이야기다. 이 책을 통해 인정을 받은 그는 정치계로 인문할 기회가 주어 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후원자도 친척인 템플경이 사망하여 좌절하고 만다. 그 후 1713년부터는 더블린의 성 패트릭의 수석사제가 되어 정치인들의 야만적 행동을 고발하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다.
스위프트의 정치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 그의 할아버지 토머스 스위프트는 영국 국교도 성직자였다. 크롬웰에 의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핍박을 당했지만, 찰스2세를 통한 왕정복고가 이루어지자 영국으로 건너가 법률 계통에서 일한다. 국교도의 영향을 받았고, 더블린에서 국교회의 사제가 된다. 카톨릭 나라였던 프랑스와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선언하고 영국 국교회가 된 영국은 앙숙지간이 되어 이후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 당시에도 프랑스와 영국을 끝나지 않는 전쟁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은 불가피하게 생명뿐 아니라 재정적 손실을 가져 온다. 일반 시민들은 전쟁비용을 대기 위해 엄청난 세금 세례를 감내해야 했고, 이로 인해 궁핍하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위프트는 명분도 없는 전쟁을 혐오했으며, 백성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탁상공론을 일삼는 황실과 정치인들에게 분노를 느꼈다. 이러한 황실의 어리석음과 부덕(不德)함이 소인국과 거인국의 전쟁 이야기에 스며들어 있다.
아일랜드 안에서 국교회는 극히 소수였다. 그는 소수파인 국교도의 사제가 되었고, 소수파의 소수파인 국교회를 옹호하는데 삶을 헌신했다. 아일랜드는 명목상으로는 영국에 속해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반식민지 상태였다. 식민지 정책을 고수한 때문에 아일랜드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했다. 그의 책 <겸손한 제안>에서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아이를 길러서 도살하는 것뿐이라고 냉소를 보냈다. 아일랜드를 대표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술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배경을 <걸리버 여행기>에 오롯이 담은 것이다. 그러니 문장들이 날이 서있고, 행간들에 분노가 서려 있는 것이다.
재미난 일치가 있다. 조너선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출판한 때가 그의 나이 59세였고, 다니엘 디포가 그의 대표작 <로빈슨 크루소>를 출판한 때도 역시 59세이다. 현재의 나이로도 결코 적지 않는 노년의 나이에 그들은 고전(古典)이 될 책들을 저술했다. 17-19세기 초반까지의 영국 소설들은 많이 닮아 있다. 심지어 영적 순례를 다룬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어둠의 시기였다.
마지막 3부에 말의 나라에 들어가 사람을 상징하는 야후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 짐승으로 비유된 인간들을 상징한다. 직접 그의 글을 인용하며 갈무리 한다.
“내가 아는 바로는 야후들은 모든 동물 중에서도 길들이기 가장 힘든 동물로서 그것들에게 수레를 끌거나 짐을 운반하는 것 이상의 일은 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결함이 그것들의 뒤틀어지고 반항적인 기질에서 생긴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들은 교활하고 심술궂으며 악랄한 동물이었다. 신체가 건장하고 튼튼하기는 하지만 비겁하며 오만하다. 털의 색깔이 붉은 야후는 다른 야후들보다 더 악랄하고 음흉하며 힘도 세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Book > 일반서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을 읽고 (0) | 2014.02.13 |
|---|---|
| 큐티를 돕는 도서 목록 [안내 및 이론서] (0) | 2014.01.11 |
| 송광택 [고전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0) | 2013.12.27 |
| 원고지 열장쓰는 힘, 사이토 다카시 (0) | 2013.12.20 |
| 잘 나가는 사람은 20대가 다르다 (0) | 2013.1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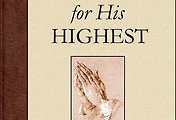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