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과 과학의 화해, 낸시머피/ 김기현 반성수 옮김
신학과 과학의 화해
낸시머피/ 김기현 반성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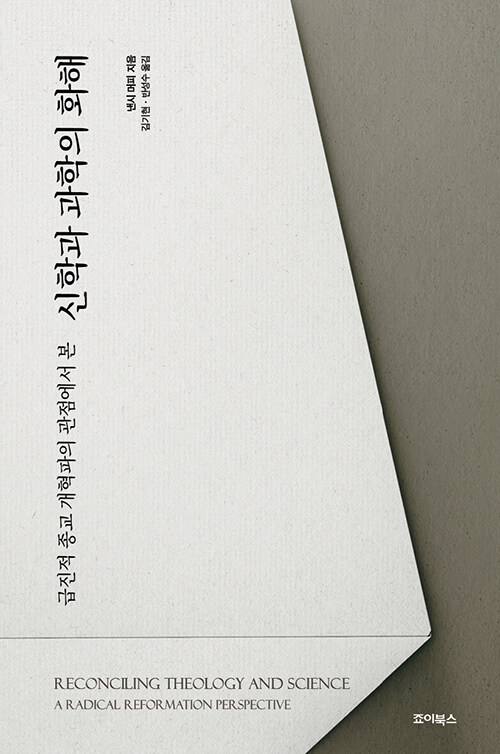
시간이 흘러 과학은 신학을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신학도 과학을 노예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은 신학을 무시하고, 신학은 과학을 적대시한다. 21세기 안에서 신학과 과학은 철로처럼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듯하다. 서로 멀리하면서도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애증(愛憎)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해디엔딩이 될 것인지 막장이 될 것인지를 두고 볼이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굳이 낸시 머피가 아니더라도 과학자 출신의 신학자들이 몇이 있다.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알래스터 맥그라스가 있다. 국내에서도 김기석 교수의 <신학자의 과학 산책>이나 장회익 교수의 <지질학과 기독교 신앙> 등은 각자의 관점으로 신학과 과학을 화해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술된 책들이다. 수년 전부터 왕성한 활동한 우종학 교수는 신앙을 가진 과학자로서 신학과 과학을 화해시키려 많은 노력을 했다. 2014년에 저술한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를 비롯해 <과학시대의 도전과 응답> 등은 이러한 시도들의 유용한 저술들이다. 하지만 필자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최근 서적은 비아에서 출간된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이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로서 활동했던 존 폴킹혼이 신학을 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관점에서 신학과 과학을 접목 시킨 것이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신학은 과학을 적대시한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하지만 일면에서는 과학과 신학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이 적지 않다. 화해라기보다는 조화라고 해야 더 옳은 표현이다. 화해의 용어는 과학은 비종교적이란 느낌과 종교를 비과학적이란 편견이 전제되어 있다. 모든 신학자와 과학자가 그런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신학자와 과학자들은 서로를 아니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신학과 과학이 화해할 수 있는가를 의아해 한다. 하지만 여기는 심각한 편견과 왜곡이 작용하고 있다. 과학은 무신론에 바탕을 둔다는 편견이 그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모든 과학자들이 무신론자인가? 아니다. 신앙을 가진 수많은 과학자들이 존재한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김영웅도 생물학을 전공한 박사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선율을 통해 <과학자의 신앙공부>와 <닮은 듯 다른 우리>라는 책도 출간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수많은 과학자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과학이 무신론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편견이다.
이 책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가 ‘급진적 종교개혁파’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재세례파로 뭉뚱그려 이해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나뱁티스트이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니 이정도만 이해가고 넘어가자.
저자는 어떤 관점으로 과학을 바라보며, 화해시키고자 하는 걸까? 가장 중요한 장은 1장으로, 이곳에서 앞으로 전개될 신학과 과학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 제시된다. 학문의 방법론만 보자면 과학과 신학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는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여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이다. 신학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한다. 저자는 1장에서 이것을 계층 모델(hierarchical model)로 제시 한다.
가장 아래에는 물리학이 존재한다. 그 위는 화학이, 그 위는 생물학이, 그 다음은 심리학이 자리한다. 가장 상층부는 사회학이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어느 정도 이해에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최근 학자들은 이러한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거나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피력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은 화학반응으로 밖에 해결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이해가 위험하다고 말한다.
“인간 행위를 전적으로 화학적으로 환원할 수 있고 화학은 물리학으로 환원할 수 있다면,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되고, 인간의 자유 의지는 한탄 환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되고 만다.”(31쪽)
이러한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창발적 실재론’ 등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저자는 이것을 ‘비환원적 물리주의’ 부르겠다고 말한다. 즉 계층 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최소 물질 단위인 원자(최근은 쿼크 로 본다)만을 실재로 보는 것과 다양한 분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책상이나 나무 등도 고려야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동일한 원자와 분자를 가진 물질이 왜 전혀 다른 종이 되기도 하는 걸까? 오직 실재를 원자로만 이해하려는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화학자들은 유기체 안에서의 화학 반응은 항상 동일하지 않으며, ‘생태학은 환경이 다르면 유기체들이 다르게 작동’(33쪽)하여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과학의 분야는 어느 정도 계층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저자는 과학계층의 최상에 신학을 자리 시킨다. 심지어 우주론보다 더 위에 둔다. 신학을 종교 또는 신앙으로 바꾸었다면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여튼 결국 모든 과학 이론은 종교의 문제, 즉 실재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2장인 ‘과학으로서의 신학’으로 끌고 간다. 이후 전개되는 주장들은 신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과학과 비교하면서 흥미롭게 끌고 간다. 저자는 메노나이트답게 4장 영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형태의 교리로 제한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는 동시에 몸의 부활을 견지한다.
마지막 6장인 ‘급진적 종교 신학과 사회 과학’은 저자의 신학 성향이 잘 드러나 있다. 짧은 글 안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으나 칭의론적으로 접근하는 개혁신학과 다르게 메노나이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무게 중심을 둔다. 결론이 약간 모호하지만 저자는 결국 과학은 신학과 서로 공조하여 사회의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공역자인 김기현 목사의 역자후기는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으며, 이 책을 읽기 전에 읽으면 책이 좀더 쉽게 다가온다.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회로 가는 길, 김병완 / 세움북스 (0) | 2022.01.11 |
|---|---|
| 2022년 문학 공모전 (1) | 2022.01.10 |
| 성경 한눈에 보기 구약 (0) | 2021.12.30 |
| 닮은 듯 다른 우리, 김영웅 / 선율 (1) | 2021.12.23 |
|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 토드 빌링스 / 송용원 옮김 / 이레서원 (2) | 2021.12.13 |




댓글